
[시사주간=신유진 기자] SNS, 소셜커머스,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은 수많은 광고에 노출돼있다.
광고업체들은 일종의 미끼인 ‘청약의 유인’으로 시민들에게 낚시질 하고 있다.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꾀어 자신에게 청약 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민들은 관심 있는 매체의 기사를 보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읽다보면 중간 중간 기사 옆에 뜨는 선정적인 광고와 해당 기사와 전혀 무관한 사진들로 도배돼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보이는 이 광고들이 무엇을 광고하는 것인지, 어떤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출처를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극 요소만 넣기 바쁘단 것이다.
한 예로 A매체에 게시된 광고는 영어학원이지만 학원 사진과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사진이 아닌 여자 사진만 달랑 올려놨다. 광고만 놓고 보면 영어학원 느낌보다 여성 상품화 느낌이 더 든다.
이 뿐만 아니다. 학원법을 위반한 과대광고와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학원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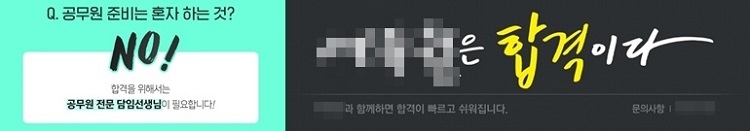
A공무원 학원은 ‘9급 공무원 합격의 첫 시작!’, ‘초시생을 합격생으로 변화시키는 000만의 관리시스템!’ 등 과대광고 문구로 넘쳐났다. B공무원 학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 1위 000!’라며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이 학원들 같은 경우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에는 과대광고 금지,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규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9호)라고 명시돼있지만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다.
과대광고를 넘어 거짓광고까지 자행하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거짓광고 적발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허위광고 사례는 코세정기 제품을 ‘축농층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해 위반했다.
이에 시민들은 허위·과대광고에 분노를 표현했다.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김모(53·여)씨는 “요즘 돈벌어 먹기 힘든 세상인데 저렇게 허위광고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 “효과도 보지 못하는데 돈은 돈대로 쓰는 게 너무 아깝다”며 “허위 광고하는 사람들이 밉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거 같아 그냥 참고 산다”고 토로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서모(33)씨는 “과대, 허위광고를 보고 혹해서 구매를 하거나 이용했을 때 실망감이 컸다” “기준도 없고, 무차별적인 허위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누가 보호해주나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나라는 꼭 무슨 일이 발생해야 뭐가 바뀌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 4월25일 ‘인터넷 신문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다” “방통위가 수많은 언론매체와 언론의 자유 표현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매체에 있는 광고 같은 경우 협약을 맺은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협약을 맺지 않은 광고 같은 경우는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심의 조치를 내린다”고 답변했다. SW
syj@economicpost.co.kr


